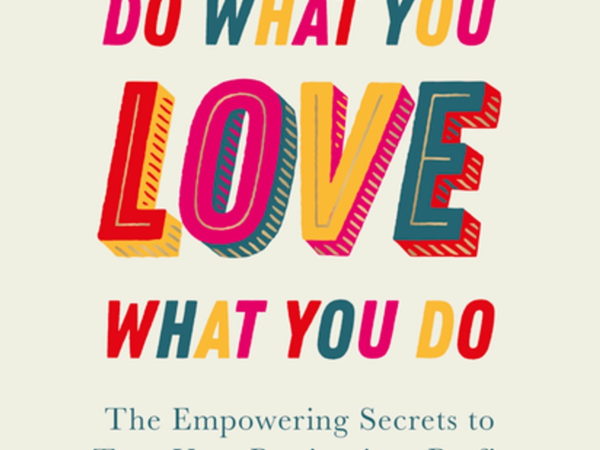조금씩 알콜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 같다. 저녁을 먹으면서 무알콜 자몽맥주를 먹어봤다. 무알콜이라고는 하는데 0.5%미만이므로 알콜이 아에 없는것은 아니다. 역시나, 알콜이 몸에 살짝이라도 도니깐 심박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나는 것이 느껴진다. 물론 심한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알콜의 반응이란 것이 이런것이구나 싶다.
알콜이 없는 삶을 꿈꿔봤다. 주말에 쉬고싶으면, 먹고싶은 피자 햄버거를 맘껏 시켜두고 무알콜 맥주와 함께 먹는다. 그래봤자 뱃속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피자는 두조각이 최대, 많으면 세조각. 햄버거는 한두개? 물론 빵이나 도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야채가 듬뿍 들어가있고, 치즈랑 버섯이랑 잘 조화를 이룬 것. 그런거 시켜두고 배부르게 먹는다. 알콜이 몸에 안들어갔으니 아쉬울것도 없다. 속이 쓰리거나 취기가 올라오거나 그럴것도 없다. 어제 먹었던 Lagunitas의 hoppy refresher랑 먹으면 솔직히 더할나위도 없다. 보통 맥주는 6병이상 먹으니 이것도 6병 먹으면 배가 부르겠지. 다만 몸속에 알콜이 전혀 없는상태로 말이다.
솔직히 이런 상태면 충분히 포만감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지 않을까. 기존에 나는 왜 술을 먹으면서 ‘취한’ 상태를 만들려고 애써 노력했을까? 술자리에 나가면 그저 그냥 소주나 맥주 시원하게 따라서 원샷하고, 계속 짠하고 마시고, 대화보다는 술잔이 빨리 비워지기만 바라고, 그러다 아마도 마지막 술자리 모임에서는 다음날 속도 너무나도 안좋았고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친구와 후배들이 다음날 거대한 숙취를 겪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있던 4차례의 술자리가 모두 그랬다. 그저 술이 뭐가 좋다고, 아마도 이건 내 생각에는 취해야 분위기가 산다 내지는 술 속에있는 당분의 유혹이 아니었을까. 음식과의 조합이 무조건 술이어야 한다는 내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것이 아닐까.
물론 저런 모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벌써부터 그립다. 만약 한국에 살았다면 술을 끊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리라고 본다. 지금 미국에서도 솔직히 만약 내가 사람을 만난다면 어느정도 분위기를 내는 술은 환영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혼술에서의 알콜프리 인생. 습관을 뿌리뽑고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싶다는 것이다.
‘취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본다. 대체 왜 나는 취한 상태를 만들어야지만 쉬었다는 생각이 들까. 취하지 않아도 쇼파에 계속 앉아서 티비보고 누워있으면, 그 자체로도 아무것도 안하는 상태이니깐 굳이 술로인한 취함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이유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렇게 명확한 이유가 없으니깐 난 과거의 습관대로만 행동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나 ‘쉬고싶다’ 는 생각이 발생하면 무의식적으로 술을, 그것도 알콜도수만 보고 가장 높은 9.8% 10% 이런 수치들을 보고, Double IPA이런 것들을 사서 무작정 채워댄 것이다. 지난번에 먹은 맥주는 9%였는데 네 캔을 먹어도 별로 취기가 오르지 않자 와인 두 병을 사서 그 자리를 채웠다. 결국 알콜성 기억상실에 내가 무슨일을 했는지도 잘 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숙취에 찜찜함이 여러모로 자리잡는다. 혹여나 내가 SNS를 잘못 올린것은 아닌지, 누구한테 전화한건 아닌지 등등.
그런데 만약 그 자리를 내가 무알콜 맥주로 채운다고 보자. 취하면 내가 가장 크게 하는 잘못된 행동은 새벽에 라면을 끓여먹는다거나, 고칼로리의 안주를 사다가 저녁 늦게 먹는다거나 하는 것이다. 웃긴것은, 그렇게 먹다보면 아무리 눈앞에 술이 있다고 한들 배에 들어가지 않는다. 술로인해 신체가 압도당하다가 오히려 신체가 정신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이미 내 몸은 적어도 두배는 오버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 알콜로 인해 내가 용기(?)를 가지고 몸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알콜이 빠진다면? 충분히 나는 처음 사온 안주로 술(이라고 가정하는 무알콜 맥주)을 즐기고 나는 나대로 적당히 잠들고 알콜로 인해 과하게 먹지도 않으니 포만감도 오래갈 것이고 만족감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먹으려고 알콜로 채우는 것 아닌가? 그럼 그냥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술이 필요한건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캠핑을 가거나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때도 그렇다. 물론 솔직히 무알콜보다 알콜성 주류들이 훨씬 역사가 깊고 뭐 그 특유의 맛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담배랑 똑같다고 봐야한다. 환각작용 때문에 그 중독성을 모르고 찾는 것이지, 술이 좋다는 것이 어딨는가. 백해무익하다. 아무리 봐도 어떤 좋은 수식어를 붙여도 핑계를 붙여도 적어도 혼술에는 전혀 좋을 것이 없다.
다시 생각해본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쉬고싶다는 생각이 발생하면 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주중에 거의 요리를 하니 요리하기도 귀찮으면? 그럼 당장 머릿속에는 피맥이 떠오른다. 홀푸즈 가서 피자 두세조각과, 맥주 4~6병 정도를 사다가 먹고싶다. 그럼 그 이후엔? 이거로 끝나는가? 아니다. 먹고나서 부족해서 와인을 찾고, 숨겨둔 육포, 과자 등 안주를 찾고 마지막엔 라면으로 끝낸다.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진다. 그런데 내가 만약 먼저 꽤 괜찮은 건강을 신경쓴 안주, 예컨데 괜찮은 브랜드의 화덕피자나 햄버거를 시켰다고 보자. 거기에다가 시원한 무알콜 맥주나 무알콜 과실맥주 네병정도가 있다. 다 먹는다. 그럼 당연히 배가 부르겠지. 알콜이 내 포만감을 마비시키지는 않으니깐. 그렇게 솔직히 네시간 여섯시간 있어도 괜찮다. 다음날 적어도 숙취는 없을테니깐. 그럼 또 다시 다음날을 온전히 시작할 수 있다. 취하지 않으면 넷플릭스 보는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내 몸이 피곤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하고 금방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이니깐.
좌우간 술로인해서 드는 생각이 많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이 3일차. 지난주에 최대가 4일차였고, 고비는 금요일과 주말이라고 본다. 저 시나리오를 생각한다. 본래는 스트레스나 쉬고싶다는 생각이 들면 뭐 단것을 찾거나 공부하거나 책을 보거나.. 그러자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잘못됬다. 내가 생각하는 정말로 원하는 ‘쉬는’ 자체에 딱 알콜만 빼본다. 금요일에는 자주 시키는 화덕피자집에서 커스톰 피자를 시켜먹고, 토-일중에 또 그렇게 생각나는 날에는 집앞 햄버거 집에서 건강한 버거를 시켜먹고. 다이어트 기간이지만, 그래도 괜찮다. 솔직히 알콜만 끊어도 10키로는 빠질 것 같으니깐. 4일차, 7일차, 2주, 한달, 두달, 반년, 1년.. 꼭좀 성공해보겠다. 알콜프리의 인생, 내 목표는 알콜프리 혼술인생이다.

이 딱 내가 좋아하는 조합. 맥주의 씁쓸한 맛과 햄버거의 조화. 이 맥주의 씁쓸한 맛을 찾았으니 이제 그것을 내 방식대로 바꾸는 것만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