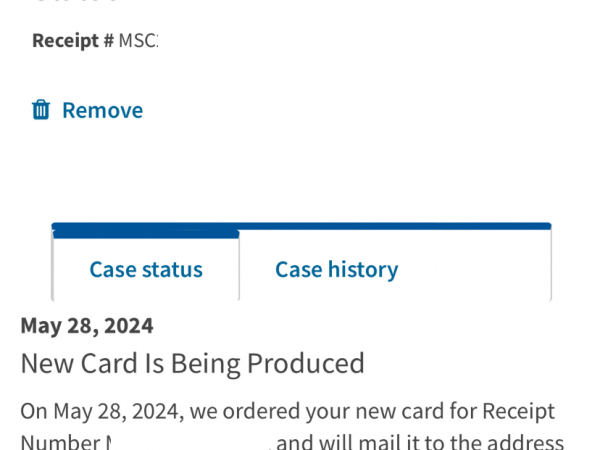2025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 내가 회사에서 했던 일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
지난 글이 거의 반년 전이라니 믿기지가 않지만, 상반기에는 프로모션과 평가에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아에 팀을 옮기기로 결심했었다. 팀원은 좋았고, 워라벨도 충분했지만 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갔다. 프로모션도 느리고, 적절한 일거리도 주어지지 않고, 약간 잉여한 시간이 계속되던 팀에 대해서, 게다가 흔들리는 리더십과 내가 수시로 off-shoring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이 팀에서 비전을 찾지 못했다.
내게 가장 강한 스파크를 준 것은 프로모션 이후 함께 일하게 된 벨라루스 출신 J와 일을 하면서부터이다. 내가 처음 이 팀에 입사했을 때 J는 나와의 1:1에서 뭐 어차피 돈벌라고 다니는거 아니냐 적당히 일하면 알아서 승진도 될꺼고 뭐 이런식의 이야기를 했다. 이사람이 직설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업무를 할당하는 스타일,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부분에서 나와 맞지 않았고 지금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나는 분명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을것이다 라는 생각에 내부이직을 알아보게 되었다.
내부이직을 알아보면서, 정말 회사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직도 많고, 생각보다 오프닝도 많았다. 프로세스도 개개 팀별로 달랐다. 나는 일단 내가 하고싶은 것부터 생각해봤다. 나는 꽤나 내 스타트업때의 경험이 그리웠던 것 같다. 웹 풀스택 개발을 했을 때, enduser product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나는 깊은 갈망이 있었다. 일주일에 80~100시간씩 코딩하던 시절, 그때가 조금 그립긴 했었다. 그래서 웹 풀스택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었다. 금방이라도 자리를 찾을 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내 풀스택 능력, 즉 뭐 리엑트나 웹에서의 그 자체 에 대한 지식이 꽤나 오래된 것들이었다. 두 팀에서 나는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봤었는데 하나는 안드로이드 앱쪽이었고 하나는 풀스택이었지만 특히 안드로이드 앱쪽은 나는 경험이 전무했지만 최종까지 갔던것도 좀 특이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둘다 쓴 고비를 마셨지만.
나는 특히나 회사에서 최근 트랜드에 맞는 Labs쪽을 가고싶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쓴 고비를 마셨다. 나중에서야 알고보니 이 팀은 스타트업처럼 움직이고 헤드카운트도 unstable하다는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즈음 사내 AI해커톤에서 우승하고 나서 난 당연히 AI를 응용하면서 user facing쪽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오산이었고, 나만의 착각이었다. 확실히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것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는 그간 내가 해왔던 것과, 앞으로 내가 하고싶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고찰해보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나는 AI/ML쪽으로 가고싶은 생각이 있었고, 회사는 좀더 자유롭게 내가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정치적인 것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싶었다. 그런데 웃기게도, 기존 내 팀에서 하던 일이 물론 테스팅 프레임워크이긴 했는데 프로덕 자체가 ML프로덕이었다. 즉 post-launch ML product validation이라고 해야할까. 즉 나는 결국 ML에 발을 담그고 있던 것이었다! 물론 뭐 모델 서빙, 피처스토어 이런 뭔가 펜시한(?) 것을 한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나는 내 메인 프로덕이 ML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여기서 나는 큰 자신감을 얻었고, 내 경력을 인프라쪽으로 fine-tuning하기로 했다. 여기서 인프라란 한국에서는 뭔가 서버인프라라고 해서 하드웨어, 네트워크 (SDN이나 그런) 쪽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미국, 적어도 우리 회사 내에서 인프라는 즉 백엔드이다. 그렇게 resume를 백엔드 위주로, 그리고 serving infra (API 백엔드 등)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었고,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이력서를 업데이트 하고 3일 뒤 나는 YT광고팀의 백엔드 포지션으로 오퍼를 받게 되었다.
즉 올해의 커리어만 본다면 연말평가 좋은등급 -> 프로모션 -> 해커톤 우승 (이건 옵셔널) -> 풀스택쪽으로 내부이직 실패 -> 백엔드 쪽으로 내부이직 pivot -> 오퍼 이런 루트를 탔었다. 팀을 옮긴게 대충 8월 초였으니 7개월동안 쉼없이 달렸었다. 그리고 팀을 옮기니 확실히 수익이 나는 팀이라 그런지 눈치보고 정치하고 그런건 정말 단 하나도 없고, 모두가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제안하고 자유롭게 성장해가는 그런 내가 원하는 조직, 내가 원하는 이 회사의 모습이었다. 오죽하면 옮기고 나서 내게 스파크를 내어준 J가 고맙기까지 했을까.
그렇게 지금 팀에서 나는 광고 백엔드를 담당하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대규모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시스템 디자인과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런 위치를 가질 수 있었다. 8개월이란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는 충분히 한 것 같다. 마음이 너무너무x10,000 편하고 그 만큼 내가 만들 수 있는 책임감,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다.
그렇게 지금은 새로 생긴 우리 가족과 함께, 새로운 출산휴가와 연말속에 다가오는 미래를, 내가 원하는 만큼 다시금 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