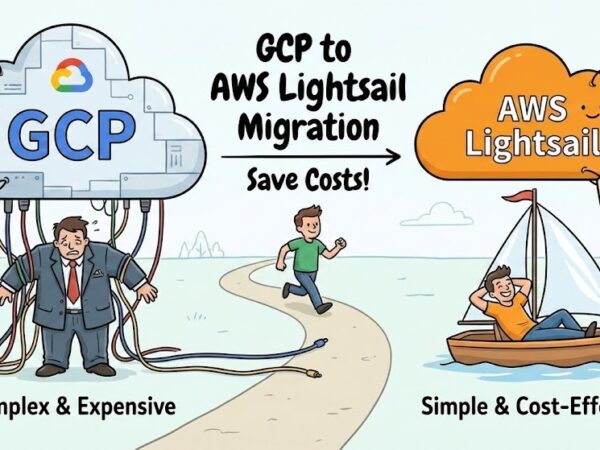요즘엔 딱 두 가지 공부를 하고 있다. 전자음악과 프로그래밍(ML포함). 후자야 내 본업과 관계된 것이기도 하고 워낙 오래전부터 공부해온 터라 크게 다른 것이 없지만 전자는 어쩌면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향후 5년 내로 내가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하고싶다는 생각만 했었지만, 오늘은 간단히 내가 언제부터 어떤 음악을 좋아했고, 어떤 사운드를 만들고 싶은지를 고찰해보는 글을 써본다. 대충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고, 왜 음악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음악 “작곡”을 하고싶다는 생각을.
나의 음악을 듣던 역사를 생각하기
초등학교: 피아노와 클래식 음악.
전자음악, 즉 Electronic Music은 정말 신기한 세계인 것 같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내가 처음 컴퓨터를 다루던 국민학교 3학년쯤 난 운좋게도 내 (아마도) 386컴퓨터에 키보드(피아노 건반)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 키보드는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 어떤 피아노 연습 프로그램 (워낙 추억의 프로그램이라 정말 찾고싶다.) 으로 연주할 수 있었고, 이때부터 몇몇 곡들을 연주해 보면서 피아노에 대한 감을 익혔다. 당시 여느 애들이 그러듯이 나도 피아노 학원을 잠시 다녔는데 하농과 바이엘, 소나타, 소나티네, 체르니 30번까지 연습했지만 크게 관심있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다. 윗집에 피아노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자주 가서 과외를 받을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다. 허나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화성학 같은 음악 이론은 당시 공부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나로써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단, 클래식 음악은 정말로 좋아했다. 초등학교 3학년때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클래식 그중 나는 쇼팽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집에 있던 클래식 명곡 모음 CD를 거의 끼고 살았었다. 물론 나도 다른 애들처럼 핑클이나 젝스키스 같은 음악을 듣긴 했지만, 거의 의도는 애들과 대화를 위해서가 아니었나 싶다.
중/고등학교: 팝송, 헤비메탈, J-pop, 뉴에이지
중학생이 되고 나서 출장을 다녀온 아버지께서 Britney Spears CD를 선물해 주셨는데 당시 내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초4때인가 영어과목이 정규과목이 되었지만 별로 영어에 관심이 없던 나는 가사를 하나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접한 인터넷 덕분에 MTV뮤비를 보게 되었고, 덩달아 BSB, 엔싱크 등을 접하고 특히나 BSB에는 정말 심취해 있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Limp Bizkit을 접하고 주로 핌프락을 들었다. 당시에 듣던 노래들은 아직도 들어도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다. 심지어 학생회 수련회의 장기자랑에서 Rollin’을 불렀을 정도이니.. 덩달아 RATM, 콘, Slipknot, 에미넘도 들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헤비메탈과 락을 좋아했는데 특히 고음, 빠른 기타음 등이 내 흥미를 자아냈다. Impellitteri, Judas Priest, Stryper, Steel Heart등. 특히 주다스 프리스트는 진짜로 진심이었다. 집에서 매일같이 Painkiller를 불렀다. 물론 락발라드도 엄청나게 빠져있었다. 한편, 피아노도 계속 쳤었는데 이루마를 선두로 한 뉴에이지를 좋아라 해서 이루마, 김광민, 유키구라모토, 조지 윈스턴, 류이치 사카모토 의 몇몇 곡을 계속해서 쳤던 것 같다. 물론 플렛이냐 샵이 엄청나게 들어간 경우는 헤매이기도 하고 딱히 고급스킬은 없었는데 그 만큼 이루마의 당시 곡들이 내겐 제격이었던 것 같다. 지금도 2주에 한번정도는 이루마나 김광민 곡을 치곤 한다.
한편으로는 모닝구무스메를 기반으로 하마사키 아유미, Every Little Thing, Do As Infinity 등등 J-Pop도 꽤 많이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단순히 이건 일본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역시나, 동시대에 유행하던 X-Japan도 엄청나게 들었던 것 같다. 이것도 결국, 뭐 어떤 화려한 음악적 요소보다는 요시키의 빠른 드럼+토시의 고음만 좋아해서 그런게 아니었을까. 결국, 자극적인 외적인 요소만 바라봤던 느낌이다. 고음, 속주 같은..
대학교: 힙합과 락발라드, 뮤즈
대학에 진학하고, 당시에는 발라드나 힙합이 대중적이었던 것 같다. (당시) 노래를 잘 못부르는 입장에서 발라드는 별로였고 그냥 패션도 당시 유행하던 스트릿 패션으로 하면서부터 (살도 130kg정도 됬었고..) 해서 다듀만 엄청나게 들었다. 어떻게 보면 다듀만 들었다는 자체가 내가 굳이 힙합에 진심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 대학진학과 동시에 야마하 S08이라는 신디사이저를 구입했다. 그런데 사실 신디사이저를 당시에는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몰라서 그냥 피아노 대용으로 썼던 것 같다. 이때부터 뭔가 음악을 하고싶었는데, 본업에 쫒겨서 그런지 거의 시간이 나지 않았다.

본격적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스물두살부터 브릿팝이나 얼터네이티브 락을 들었다. 너바나나 U2같은. 그러다가 Muse에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정말 지금까지도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아티스트인 것 같다. Haarp콘서트부터 해서, Supermassive Black Hole. 특히 Map of Problematique는 항상 내가 무언가 물음이 생기거나 힘들거나 할 때에 큰 도움을 주던 곡이었던 것 같다.
한편으론 이때부터 나는 새벽 4~5시 기상을 시작했는데 새벽에 주로 mbc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주연의 영화음악을 들었다. 지금처럼 영화도 잘 보지 않았고, 영화음악은 더더욱이나 기억을 하지 않았지만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영화음악만큼은 내 20대 초반의 새벽기상 루틴을 함께했다. 또한, solopianoradio.com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유료결제를 해가면서 들었다. 이때에 듣던 뉴에이지의 피아노나, 잔잔한 영화음악이 주는 마음속의 차분함이 너무나도 좋았다. 특히 후자는 더 그랬다.

20대 중후반: EDM
회사생활이 끝나가고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부터는 음악적 취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연찮은 계기로 모 EDM페스티발의 일손을 도울 기회가 있어서 이에 참여하다가 처음으로 EDM을 듣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대체 EDM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중학교 3학년때인가, 내 인생영화로 남아있는 트리플엑스의 모든것들이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다. Rammstein을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자극적인 퍼포먼스가 아닌 마초적인 모습, 테크노스타일의 락 음악 등. 그리고 이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프라하의 클럽이 아주 강력했다. 이 영화의 모든 OST를 좋아한다. 아마 테크노 음악도 그중 하나였으며, EDM은 미국여행과 유럽여행을 하면서 어쩌다 매번 클럽을 가면서 자연스레 접한 것 같다.

2013년 이비자와 유럽 클럽투어를 다녔을 때 난 진정으로 클럽에서 음악을 즐기며 사람들과 부딪치는게 너무나도 좋았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명한 디제이인 Avicii나 Afrojack, Hardwell만 알았지 심지어 내가 지금도 좋아하는 Fedde Le Grand도 몰랐다. 귀국 후에는 DJing을 조금 배워보긴 했는데, BPM을 맞추고 스타일을 맞추는 것 이외에 크게 흥미를 못느꼈다. 하지만 그런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2015년 결혼 후 미국에 진출하고 나서, 이때부터는 더 이상 온전히 음악을 듣는 시간을 만들기는 어려웠다. 한국에 있을 때 솔로였을 때에는 지하철을 타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곤 했는데, 일단 이어폰을 쓸 일이 거의 없었다. 미국에서 거의 와이프와 함께있다 보니 와이프 취향을 많이 따라갔던 것 같다. 와이프는 kpop, 특히 여자 아이돌 그룹을 좋아했는데 나도 덩달아 몇몇 걸그룹들을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은근히 걸그룹들이 일렉트로닉 음악을 많이 채용한 것을 알았다. 일렉트로닉 팝이라 하던가?
30대: French Pop (Electronica), French Chanson
서른이 넘고부터는 좀더 조용한 음악을 찾았다. 헤비메탈이나 락음악은 거의 듣지 않았다. Muse 는 예외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이또한 음악이 점차 일렉트로닉화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조용한 음악을 찾다가 2019년부터 나는 French Pop과 샹송을 듣기 시작했다. 사실 Gims Maitre 같은 French rap도 듣긴 했는데 뭔가 그루브나 그런것들이 멋지긴 해도 가사나 그런것들을 보면 조금 꺼려지는 면이 없지않아 있었다.
프랜치 음악중, 특히 일렉트로닉과 접목한 음악이 가장 좋았다. 아마도 전자음악과 관련해서는 프랑스가 선구주자라서 그런것일까. DaftPunk, David Guetta등.. 거의 대부분의 프랑스 팝 음악에는 일렉트로닉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었다. 혹은, 전통적인 샹송 음악도 좋았다. 뭐 La vie en rose같은.
그래서 2021년에는 아코디언도 사서 조금씩 연습했다. 이때 내게 두 가지 목표가 생겼는데, 하나는 아코디언으로 프랑스 음악(샹송)을 연주하고 싶다는 것과, 하나는 일렉트로닉 음악을 작곡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전자는 아무래도 유럽 역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쩌면 가장 쉽게 듣고 접하던 것이 아니었나 싶고, 물론 파리나 유럽에 대한 그 낭만에 대한 이상도 있긴 하다. 그냥 항상 느끼지만 아코디언이 가져오는 그만의 ‘정서’가 있고, 그게 너무나도 따뜻하다. 내가 지금까지 듀오링고로 프랑스어를 900일 넘게 공부를 한 것처럼, 딱히 이렇다 할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냥 주말에 한시간 정도씩만 연습하기로 했다. 당장 내가 아코디언으로 먹고살 것도 아니니깐 ㅎㅎ
왜 작곡을 하고싶은가?
이제서야 본론으로 왔다. (항상 내 생각의 전개의 스타일은 내가 왜 이걸 관심있어 하는지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꺼내놓아야 본격적으로 가능한 것 같다.) 사실 작곡이란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큐베이스를 공부하려 했는데, 사실 음악 ‘툴’은 어차피 사용법이야 비슷비슷하고, 중요한 건 결국 툴보다는 음악을 작곡하는 그 방법론이다. 아니, 방법보다도 그냥 만들면 되는데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20대가 되고, 맥북을 주 PC로 바꾸면서 로직을 끄적이면서 작곡은 해보고 싶었는데 이론이란걸 공부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작곡은 왠지 뭔가 다른 세계(?)라는 생각을 했었고 계속해서 미뤄왔다. 정확히 말하면, 난 솔직히 예술행위를 하고 싶었다. 미술이든 음악이든 뭐든 좋았다. 그런데 자꾸만 현실이 명확하게 고착이 되지 않으니깐, 계속해서 미뤄왔다. 그냥 언젠가는 삶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엔지니어로써 도달할 수 있는 최고까지 가면, 그 이후에 음악을 하자고 결심했고 지금이 아마 좋은 타이밍이라 생각해서 4월부터 공부했던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일단 작곡이라는 세계는 흥미롭고, 어려서부터 계속 미뤄왔던 분야 중 하나이다. 그리고 지금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든다. 프로그래밍처럼, 인터넷에 수 많은 리소스가 있어서 공부하기도 수월한 것 같다. 어쨌든간에, 나의 감정과 스토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해도 즐거운 일이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막상 공부를 해보니깐 뭐 화성학이니.. 그런건 암기보다는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더라. 기본만 알면 말이다. Ableton사용법을 익히니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크게 어렵지 않다. Logic도 구입을 했었는데, 아직 내가 DAW를 비교해보고 그럴 짬이 아니더라. 일단은 그래서 음악의 역사를 위키들을 보고 익히는 중이다. 정말 장르들이 많은데 적어도 내가 하고싶은 분야는 알겠더라. 일렉트로닉 음악, 즉 전자음악.
전자음악이라고 해봐야 크게 막 거창한 것은 없다. 그래도 무엇보다, 좋은 비트 위에서 마치 소설처럼 어떤 phase를 만들고, 뭐 잔잔하다 긴장하다 잔잔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충분히 내 스토리를 담아내는 것과, 한편으로는 EDM을 제작하고 싶다. 계속해서 춤추게 만들 수 있는 음악. 전자는 아무래도 French-pop과 synth pop쪽의 느낌이 강할 것이고, 후자는 아직도 공부할 것이 많지만 적어도 너무 소모성 음악이 아닌, 어느정도 짜임새가 있는 EDM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직은 생각이 러프할 뿐이고, 아직은 공부할 시간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래도 난 이 프로젝트를 길게 보고있다. 적어도 10년정도. 일단 이쪽 공부는 재밌다. 음악을 듣는 것은 내 취미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이를 분석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음악적인 소양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장 막 학위를 취득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다. 음악을 당장의 ‘업’으로 생각해서 돈을 번다거나 그럴 생각은 지금 당장에는 없다. 사실 초반에는 어떻게 돈을 벌지 하면서 좀 찾아본 결과, 찍어내기 식으로 만드는 음악은 크게 구미가 댕기지 않는다.
나만의 스타일
한편으로는 나만의 스타일을 갖추고 싶다. 결국, 엔지니어로써 음악을 만드는 나는 음악에 ML요소를 삽입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의 음악이 다양한 버전으로 나오는 것인데,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서 살아있는 음악이 나오는 것이다. 한편으론, ML이 개입해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리듬과 비트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ML엔진을 만들어 보는것도 생각해보고 있다. 또한, 예전부터 생각한 앱을 통한 live festival과 AI-home festival. 이런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내가 처음 EDM을 접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들이다. 아직까지 AI-powered EDM producer가 생소한 것 같다. 사실 내가 이를 생각한 것도 맞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공부해볼 만 하다고 생각이 든다. (중요한 것은 ML과 EDM공부의 동기부여가 팍팍 된다.)
예술을 한다는 것은, 나만의 스타일도 있겠지만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도 필요한 것 같다. 이건 마치 글을 쓰는것과 비슷하다. 미술을 하는것과도 비슷하다. 내 화풍이나 문체가 있고, 내가 주로 다루는 소재가 있고. 그럼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생각하면서 음악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당장에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나만의 스타일은 계속해서 만들고, 듣고 하면서 정립해 봐야 하는 것 같고, 나의 스토리는 글쎄. 그냥 러프하게 드는 생각은, 무언가를 할 때에 겉모습에 취해서 이에 대한 스토리를 듣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갖은 고생을 다하게 되는 이야기. 사실 이게 내 이야이긴 하다. 실리콘벨리와, 스타트업의 성공이라는 그 외면에만 심취해서 막상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된 내면도 없어서 기나긴 세월을 허공 속에 날리기만 했던 나날들. 이 블로그의 제목처럼, 현실과 이상의 중간을 추구해야 했는데 그저 이상만 쫓던 시간들, 하지만 다른 스토리와 다른 것은 그게 허상인 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시간이 정답을 가져왔다는 것.
예술가의 삶, 시작.
결국 이런 이야기도, 스토리도 모두가 창작을 요구하고, 사실 창작이란 것은 꾸준함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주말마다 EDM연구와, 스토리를 써보려고 한다. 주중에는 본업에 집중하고. 결국, 내 세계관이 점차 이어지는 느낌이다. 유라임을 통한 그 데이터와 웹에서의 시각적인 효과들, 그리고 ML. 거기서 이어나오는 기술적인 세계관과 이를 표현하는 음악이라는 도구. 한편으로는 본업에서 내가 쌓아가는 탄탄한 소프트웨어의 기본기… 결국 이 모든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본래 생각은 삶이 어지러울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정돈된 삶, 그 속에서 모든것들이 시작된 것이다. 하루하루, 차근차근 내가 가진 세계관을 잘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