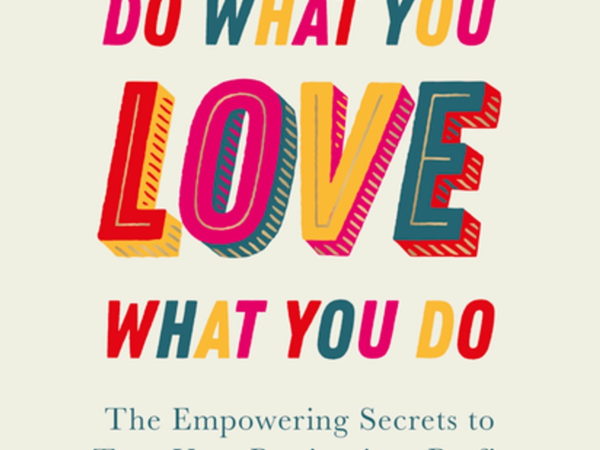10월이 끝나간다. 비오는 캘리포니아는 운치가 엄청나다. 거의 7개월동안 비구경 한번 못했는데 이제서야 신나게 하는 것 같다. 오랜만의 비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거세서 산책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나뭇가지들이 날라가고 뒤짚어졌는지, 마치 이제 2021년이 다 끝났다고 외치는 것 같다.
일요일 저녁인 오늘,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어쩌면 오랜만에 느끼고 있는 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를 돌이켜보는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블로그를 뒤져봤다. 미국에 와서부터의 생각들은 대부분 봤던 것들이라 한 2009년정도의 나를 바라봤다. 어쩌면 개발자로써의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그때의 나는 참으로 어렸지만, 어쨌든 유학과 해외취업이라는 큰 틀과, 어느정도 하이레벨, 아키텍처로써의 경력을 쌓자는 생각을 했었다. 특히, 이때의 내가 선택한 ‘자바’라는 언어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결국 풀스택으로써의 개발은 ‘개인개발’로 가져가게 된 것도 그렇다. 다시금 어쩌면 정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써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조금은 회사의 그 큰 틀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15년에 걸쳐 시작된 내 정말 폭풍과도 같은 시간들이 끝난 것이다.
15년의 시간은 대부분 다 내 사진속에 있었다. 물론, 대부분 2012년 정도부터 기록된 것들이긴 하지만, 쭉 봐온 나의 지난시간의 삶들. 유학으로 고전하던 시간들, 결혼, 신혼여행, 그리고 미국에 와서 스타트업 한다고, 대학원 다닌다고 몇 년을 고생하고 또 취업안되고, 사기당하고, 그렇게 보낸 5년이란 시간. 그리고 결국엔 ‘정석’적인 루트로 집중해서 지금의 결과를 얻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어쨌든간에 나는 2009년쯤에 결심한, 한국에서는 개발을 하지 않고 적어도 외국계로 가겠다는 생각을 이제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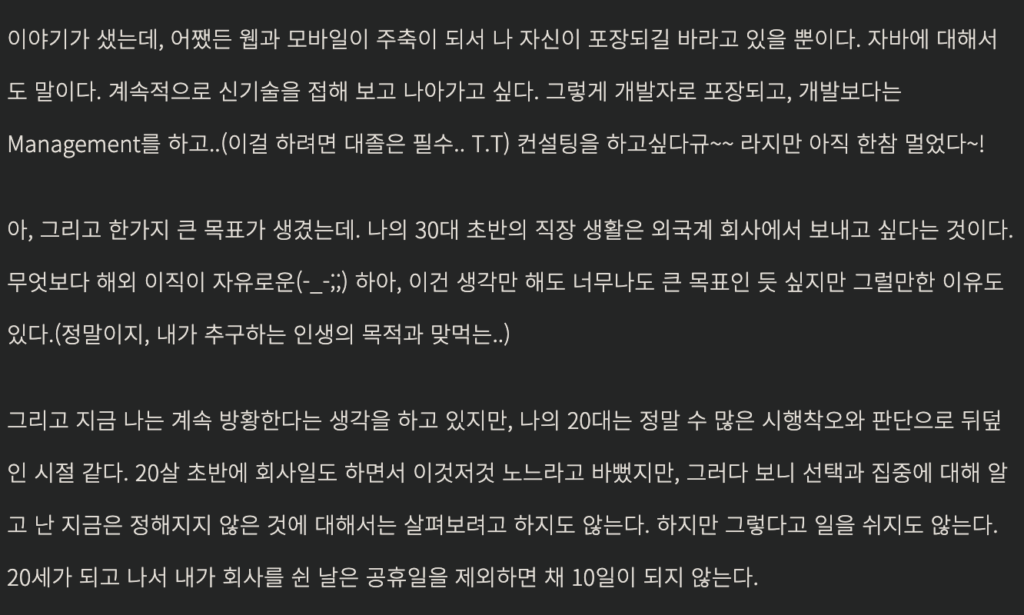
그래서 큰 목표가 끝났다.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가 진짜 회사를 다니는 것인가 가물가물 했는데, 롱위캔드 이후에 곰곰히 생각해봤다. 안정에 대해서, 드디어 안정을 찾았는데, 그리고 이 집에도, 미국 생활도 가방끈이 훨씬 길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본래 원하던 그 안정은 부모님의 품이었다. 난 그런 따뜻한,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지 못했다. 2000년에 서울로 전학을 오면서 생겼던 내 방에서 나는 결혼전까지 15년을 살았다. 그런 ‘익숙한’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 와서는 2년에 한번 이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워낙 비싼 이 베이지역에 살면서 나만의 공간을 갖지 못했다. 아니, 집 전체가 사실 나의 공간이긴 했다. 와이프와 쉐어하며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가꿔 가는 공간이었는데, 내 공간이 확대되고, 공유하게 되고 그런 공간이 되면서 사실 손쉽게 나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었지만 나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아주 초창기에는 그저 겉멋에 들어서 주말에 영화보고, 뉴욕타임즈 보고 그러면 뭔가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럴싸하게 나와 와이프의 스타일대로 거실을 꾸며두어도, 따뜻함은 가져오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아주 극 초반 미국생활에서는 조금의 따뜻함은 있었다. 가을쯤에 미국에 와서 학교에서 들리지도 않는 인도애들 발음과, 학사일정을 놓쳐서 생기는 재수강부터 해서 정말 온갖 일이 비일비재했다. 저녁늦게 수업을 듣고 집에 오면 그 공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와이프도 집에만 있던 때라서, 집에 오면 우리는 거의 매일 야식을 먹었다. 나는 술을, 와이프는 맛있는 내가 해주는 요리를 먹었다. 난 당연히, 신혼이고 미국 생활의 묘미가 아니겠나 싶었지만, 집안과 밖에서의 그것은 달랐다. 집밖에서 나는 계속된 연달은 실수와 실패로 인해 점점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누군가랑 말거는 자체도 힘들었고, 부담스러웠다. 오죽하면 당시 스타트업을 하며 얹여살던 공유사무실에서 카운터 직원이 건내는 인사말이 부담스러워서 퇴근할때는 뒷문으로 하곤 했다.
스타트업을 처음 했을 때에는 학교랑 회사랑 잘 컨트롤 할 수 있을것처럼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미국생활은 너무나도 경우의 수가 많았다. 처음 겪는게 너무나도 많았다. 신혼에, 첫 미국 대학원 생활, 첫 미국생활, 첫 미국에서의 스타트업 등 모든게 새로운 것들이었다. 그래서 난 집이 정말 ‘아늑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집은 그저 나를 ‘폐인’으로 만드는 공간이었다. 난 집에서만 같혀 있었고, 집에서 뭔가 되기를 바랬지만 실제로는 내가 밖으로 나와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었다. 게다가 도움을 받으려고 한국인들을 만나면 여차 하면 사기부터 들이밀려고 한다. 어쩌면 대인기피증에 공항장애 비슷한것까지 겹쳐서 미국 초기 4년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기였다.
그렇게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내가 그나마 좀 풀리기 시작한 것은 억지로 밖으로 나오면서부터였고, 안되는 길을 깨끗하게 접고나서부터였다. 카페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대학원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스터디그룹을 만들고 스터디를 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일단 하면 된다는것부터 사실 백인을 막 많이 대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까지. 이런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까지는 고생하지 않았을텐데.
말이 살짝 샜는데, 어쨌든 난 공간이 주는 그 안정감이 필요했다. 20대때의 그 집에서의 안정감이 필요했다. 결국 지금처럼, 커리어가 안정된 루트를 향해가는 시점에서는 이제서야 알았지만 결국 답은 공간이 안정이 되려면 삶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물론 요즘시대에 ‘안정된 직장’이란게 옛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세계 최대에 안정된 개발 회사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결국 내가 느끼는 것은, 적어도 여긴 내 실력 이외의 것때문에 불확실성을 느낄 필요는 없는 공간이라는 점이었다. 그래서 회사가 되고, 급여를 받아보니 와이프도 나도, 이제야 우리는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면서 그간의 우리가 생각했던 불확실성이 거진 해결될 것이 보이면서 이제야 한숨을 돌리게 되며, 어쩌면 신혼때에 느꼈어야 했을 (결혼 전에 미리 해뒀어야 했을) 상황을 이제서야 느끼며, 마치 신혼과도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다. 참으로 웃기다. 그렇게 미국에 와서 자질구리한 물건들을 사대고, 취미를 늘리고 그러면서 나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결국 모두가 헛수고였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공간을 꾸밀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이 집은 내집이 아니지만 조만간 집도 사고, 그러면서 조금 더 미국에 정착하면서 나는 그 전체적인 공간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 부모님께서 내게 서울생활 15년동안 주신 것들이었다. 그러한 공간들, 그 ‘안정된’ 공간에서 나는 따뜻함과, 아늑함과, 최고조의 안정을 느낀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을 벗어났을 때, 애써 겉치장을 비슷하게 꾸며봤지만 결국 그 안정의 의미는 다른데에 있던 것이었고, 집안 전체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내가 극복해야 할 하나의,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을, 그것이었던 것이다.
그간 내가 혼란스러워 했던 것들, 그래서 만들어졌던 나쁜 습관들. 이젠 알겠다. 이 하나의 ‘우리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드는 자체가 말이다. 앞으로 태어날 2세와, 우리 가족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 이제야 그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울타리를 치고, 우리 가족을 한지붕 아래서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의 책상이 7년전의 그 차가운 책상이 아니라, 나의 ‘진짜’ 공간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베이지역에서 우리 부부가 사는 이 공간이 진짜 우리의 공간이 된 것이다.
한가지가 더 필요하다. 바로 ‘루틴’이라는 것이다. 충동적이지 않고, 루틴화된 것. 어려서 나는 6-7시만 되면 어머니께서 아버지 식사를 준비하고, 아버지는 8시전후로 출근을 하시고, 6시 전후로 퇴근을 하시고 그쯤에 밥을 먹었다. 주말에는 아침이나 저녁을 같이 하고, 조금 더 fancy한 음식을 먹거나 외식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결국, 아버지의 루틴에서 나는 어느정도 안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루틴이 결국, 가정의 안정을 만든 것이다. 난 아버지처럼 100% 똑같은 루틴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나만의 루틴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이 늘어나면서, 점차 우리의 공간속에서 따뜻함은 더해져 갈 것이다.
결국 그거구나, 이 미국이란 자본주의의 삶.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안정적인 삶. 그리고 그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끝없이 발전해 나가야 하는 나의 실력. 결국 평생 공부라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평생 공부’의 방향을 잡기 위해 오늘도 노력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