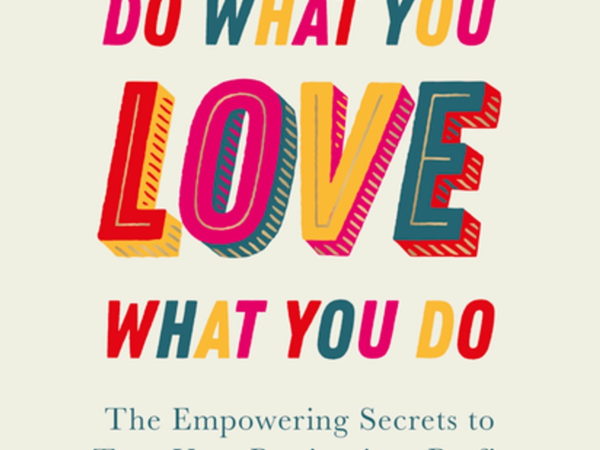2년 전만 해도 병특이 언제 끝날까 노심초사 시간만 재고 있던 나였는데, 어느새 학교를 복학하고 2년이다. 병특을 하는 동안은 아무래도 20살때부터 다른 대학생들과 다르게 동기 친구도 많이 없었고 그들과의 추억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학에 복학하면 가장 하고싶던 일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대학때의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은 되려 너무 많아진 친구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내겐 변질된 속마음이 있었다. 바로 모든 관계가 술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때문에 거의 뭐 대부분을 술을 사주면서 후배들과 친해졌고, 물론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본연의 그 “관계 형성” 에 대한 나의 마인드를 다시금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 다시금 느끼는 바로써는 내가 관계를 형성하는 자체가 그게 긍정적인 영향이 아닌, 내게는 그저 “술친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 즉, 술로 인한 어떠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지.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출간하는 책은 1000권이다. 인구가 많은것도 한 몫 했겠지만 청교도 문화 중심인 그들은 가정에서의 생활을 매우 중시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업무가 끝나고 나서 따로 회식을 하러 가거나 하려들지 않고, 서로간의 가정을 존중해준다. 우리나라는 그런게 있을까? 처음에는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도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뭔가 자신만 손해본다는 느낌이 크게 작용하니 당연히 참여할 수 밖에. 관리자 입장에서도 회식을 통해 직원들의 충성심을 높힌다고 하는데, 글쎄 그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회식과 야근 철야로 물든 삶이 말이다.
어제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서 아이디어가 솟구친다고 말이다. 이 말씀은 그간의 내 철학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말씀이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야지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인데,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별 쓸때없는 얘기를 하다 끝난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 다시금 내 관계에 대한 철학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나 자신을 외로움을 못버티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 세상에 왠지 나만 홀로 남겨진 느낌이 싫었다.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그랬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다방면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그렇게 애써 노력을 해왔다. 20살부터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일주일에 3회 이상은 누구를 만나러 다녔던 것 같다. 그리고 술이 가장 좋은 관계형성의 수단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는 곧 부작용을 일으켰다. 대화가 위주가 아닌, “술”이 위주가 되어버리니 정말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심각하게 쓸떄없어진 것이다. 내 주위사람들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나의 행동 자체가 잘못됬다는 것이다. 몇몇 부분에서는 심지어 관계속에서 “판타지”까지 생기게 되었다. 참으로 내 자신이 한심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술먹은 다음날 연이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술을 끊고, 더 이상의 관계 형성에 대한 내 자신의 철학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관계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속에서 이끌어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방랑객들이다. 지구라는 행성도 어찌보면 100여년 남짓, 우리가 머물다가 가는 그런 곳이다. 지금 내가 평안을 찾고 있는 이곳에 언제까지나 머문다고 할 수도 없다. 스쳐가는 인연이고, 그 중심에는 내가 존재한다. 우리생에 진정한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아닐까. 과연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나 자신과의 대화에, 다른사람과 술자리에서 투자하는 시간만큼, 나와 대화를 했는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잠깐의 스쳐가는 생각인 것 같다.